종로에 나갔다.
여전히 붐비는 사람들 속에 유독 저에 눈을 끌었던 단 한가지.
10000원에 비디오 5장.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지만, 뿌리칠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디오 구매가 아닐까 싶다.
여러가지가 눈에 들어 왔지만 여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영화.
브라이언 드팔머의 scarface와 샘 페킨파의 wild bunch.
1980년 봄. 쿠바가 마리엘라 항을 개항하자 반카스트로를 외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수천명의 쿠바인들이 미국의 플로리다항으로 입항하는 다큐필름(올리버 스톤 냄새가 남-참고로 올리버 스톤이 이 영화의 각본을 썼다니 군데 군데에서 혐의가 더욱 짙음)을 시작으로 영화 제목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토니 몬타나(알 파치노)는 석양이 물든 마이애미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암흑가로 흘러들어간다.
물론 모든 느와르나 갱스터무비(특히 이 영화는 하워드 혹스의 동명 영화에 올리버스톤과 브라이언 드팔머 두 사람의 오마쥬라고 보여진다.-마지막 엔딩 크래딧)가 그렇듯 이 영화 또한 음습한 조명, 음모와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핏빛 복수로 얼룩지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한 인물에 촛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태생이 아메리칸 뉴시네마에 그 명맥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가 브라이언 드팔머의 이후의 영화와 얼마만큼 연장선을 이어주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영화에 대해 오마쥬를 바치며 패러디의 제왕 혹은 히치코크의 후계자 인가를 각각의 시퀀스와 이미지 혹은 미징센은 말해 준다.
world is yous. 거대한 기구에 점멸하는 불빛을 바라보는 토니의 시선과 기구의 교차편집은 예상컨데(블레이드 런너는 1982년작이고 스카페이스는 1983년작임) 블레이드런너의 데커드가 보는 전광판에서의 그 영상과 비슷한 인상을 주며, 초반에 처음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토니의 친구가 토니의 앞에서 전기톱으로 살해 당하는 장면은 사이코에서의 샤워씬과 버금가는 공포를 느끼게하는섬뜩함을 준다(후에 이 장면은 우리 영화 장현수 감독의 게임의 법칙에서 패러디한듯 함).
토니가 쏘사의 명령을 받고 폭탄을 장착된 차에 아이들이 그 차에 타면서 보여지는 긴장감은 히치콕의 사보타주를 연상시킨다.
또한 그의 역작 칼리토 또한 이 영화가 기반을 했음을 알 수 있다.(한 인물의 꿈과 뒤에 이어지는 허무한 죽음.)
마지막 시퀀스에서의 여동생을 잃은 토니가 자신을 배반했다고 믿는 쏘사 일당의 습격을 온몸으로 막는 장면은 흡사 오우삼의 영웅본색을 연상케하며, 한편으로는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대표작이랄 수 있는 보니&클라이드에서의 기관총 난사에 의해 벌집이 되는 주인공을 연상시킨다.
(정말 놀란 것은 후에 그가 만든 미션임파서블에서의 초반 세트 디자인이나 색채는 토니의 집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확인해 보시길)
또한 알파치노는 여기서 정말 뒤어난 연기를 선보이는 데, 개인적으로는 대부에서나 최근 애니기븐 선데이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흡입력이 있고, 미셀파이퍼는 정말 멋드러지게 마피아 보스의 정부 역할을 하는 데 토니와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신신애의 "세상은 요지경" 댄스를 선보인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길 정말 똑 같다.)
얘기가 나왔으니 오우삼의 스승이랄 수 있는 셈페킨파의 대표작 와일드번치를 보자.
이 영화를 보면 도대체 이게 1969년 영화 맞어? 하고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서사구조와정말이지 폭력의 미학또는 폭력의 피카소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영화 사상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많은 시체를 화면에 쏟아 붓는 영화는 엘토포 이후 처음일 것이다. 페킨파는 영화에서 당신네 인간들이 하는 폭력에 비하면 이건 폭력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화를 시작해서 후반으로 갈 수록 폭력에 대한 묘사는 점층된다.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파이크일행의 등장과 프리즈프레임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편집이 왠지 모를비징함마저 느끼게 한다.
페킨파는 근본적으로 사그러져 가는 웨스턴 쟝르에 그에 따라 사라져가는 총잡이들의 최후를 정말 놓치기 싫은 듯 슬로우모션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엮어간다.
오우삼 역시 서사구조는 아마도 1997년 반환을 앞둔 불안한 홍콩의 미래에 그 옛날 강호 무림을 주름 잡았던 무사들의 향수에 총을 쥐어주면서, 미장센은 샘 페킨파의 슬로우모션을 택했을 것이다. 또한 오우삼의 역작 첩혈쌍웅의 가장 큰 주제.
쫓는 자(경찰)와 쫓기는자(범죄자)의 우정에 대한 버디 무비라는 점에서는 파이크와 쏜튼의 대립, 우정과 닮아있다.
모 CF광고처럼 세상을 다 가지고 싶었던 토니가 인간적인 본성을 무시한 파트너를 결국 포기하
고 죽음을 맞이하고, 파이크 역시 한탕 크게 벌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동료인 엔젤을 구하러 예정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는 두 감독이 결국은 폭력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즈음 들어서 하는 생각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장들의 영화는 점점 빛을 발하지만 정작 그 빛을 투과해서 영사기를 통해 비춰지는 스크린은 없어지고 이렇게 비디오라는 갇힌 4:3 화면속에서 볼수 밖에 없음이 애처로운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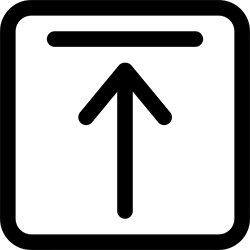

아무거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광고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