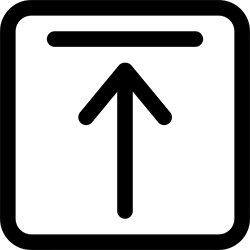감기에 걸렸다.
점심 때 출발, 안산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여덟시쯤이었다. 일요일이라 우리가 장부를 두고 밥을 먹는 식당이 문을 열지 않았다. 괜히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우겨서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고기집에 갔다. 어쩐지 끌려서 소주 두잔을 마셨는데 고것 가지고도 속이 엉덩이가 확확 했다. 넷이서 삼겹살 육인분을 다 먹는동안 텔레비전에서는 여러사람이 릴레이로 헤엄을 쳐 대한해협을 건너고 있었다. 오랫만에, 신 김치에 싸먹는 고기맛이 좋았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양치를 꼼꼼히 했다. 겁이 났기 때문에. 따끔따끔 아프다 했더니 입안에 조그맣게 헌 곳이 있었다. 칫솔머리가 닿을 때마다 눈이 감긴다. 오한이 나서 있는 옷을 다 입고 지난 겨울 스탭복으로 얻은 티셔츠까지 껴입었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선득한 검은 레쟈소파에 누워서 신경숙씨 소설을 들추었다. 책은 ㅈ씨가 책상에 두고간 것이다.
아까 나는 자동차 뒷자리에 누워있었다. 안산에서는 아무도 길을 몰랐다. 그냥 이 길 저 길로 다니다가 이쁜 아가씨들에게 이 근처에 혹시 애들 노는 놀이방이 있나요?, 하고 묻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공업단지 쪽으로 들어갔다. 누운 채 하늘이 보이고 가로수 잎들이 보였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싶은데도 무슨 까닭인지 나는 아이같이 마냥 그러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상하게 한산해. 다들 어디로 갔을까. 앞자리에 앉은 ㅇ이 연신 말했다. 운전을 하던 ㅈ이 대답했다. 야, 여기 옆구리, 파스 잘 붙었나 좀 봐주라. 이건 왜 시원하질 않냐. 그러다가 잠이 들었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겸연쩍어 여기가 어디야? 하고 물었다. 아직 안산이야. ㅇ이 말한다. 이제 돌아가자. 아직도 파스 붙인 델 쓸어보는 ㅈ더러 내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다. 대신 담배는 좀 그만 피우라고. 담배때문에 허리 아픈 것 아니냐고. 목이 칼칼했다. 해가 슬슬 지고 있었고 그리고도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을 아무도 몰라 이리저리 둘러서왔다.
깨고 나면 영 늙어버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랫만에 하였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서둘러 다시 안산에 간다고 한다. 아까 고깃집에서, 드디어 해가 져서 텔레비전 속의 바다가 검푸른 색이 되었을 때 ㄱ이 말했다. 어어, 저기서 수영할라카다가는 그양 무서버서 죽겠심더. 그래. 나 옛날에 제주도 가는 배를 탔었거든. 겁나서 죽을 것 같더라. 거기 빠졌다가는 악 소리도 못내고 그냥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 신 김치를 집으면서 내가 말했다.
200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