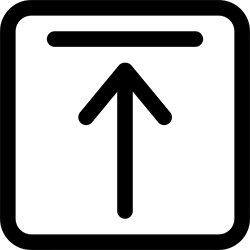87년은 내가 중학생이 된 때다.
까까머리가 되어서,
국민학교때 여자친구들도 만나기 꺼리던 수줍은 시절이었다.
만리동언덕에 위치한 나의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자
예전에는 깡패학교로 명성이 자자했다던 곳이었고...
(물론 그때는 공포의 똥색교복을 입기 전이었다)
국어선생님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김혜숙 선생님인지 김혜순 선생님인지 조금 햇갈린다.
아무튼
나는 지금 그 선생님 생각이 마구 떠오른다.
선생님은 막 결혼하신 이십대 후반의,
말하자면 지금의 내 나이의 신혼이셨고
우리가 입학했을 때 이미 배가 약간 불룩하셨던 걸로 나는 기억한다.
물론 그건 똥배가 아니었다-_-
선생님은
국어선생님 답게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 이름도 모두 외우시는, 한마디로 살가운 분이셨다.
담임을 맡지는 않았지만 우리반 애들에게 특별히 잘 해 주셨던 것도 같다.
우리반 애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
2학년 국어선생님과 특히 친하셨고(중매를 주선하셨다는 말도 있었다)
틈날때마다 사전에서 순 우리말을 찾아 정리하시는 취미가 있다고 하셨다.
그해는 유난히 복작대는 세월이었다.
올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다고 할까...
년초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이어
유월달에는 급기야 크게 한방 터졌던 기억이 있다.
마치 올해 유월에 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함성과 같은 데시벨의 목청이
너무도 용감하고 열정적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기억이다.
집이 명동이고 학교가 만리동인 나는, 우리는
6월 내내 아침에 치약과 마스크, 비닐봉지를 가지고 등교했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꼭꼭 잠그고 수업을 했으며
하교길에는 치약바른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혹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주차장이 되어버린 버스노선을 피해 걸어서 서울역, 남대문을 지나가곤 했다.
때론 데모하는 거 구경도 하고
괜히 흥분해 도로를 점거한 시민들 주변에서 맴돌기도 했다.
그러다 페퍼포그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눈을 비비며 지하상가로 튀거나
주변 상가에 들어가 촛불연기에 최루탄이 사그러지길 기다렸다.
어느 토요일 하루는
형과 교회에 다녀오다가 한국은행 앞 로타리에서 경적시위를 하는 차들을
한참이나 쳐다봤던 기억이 있다. 장관이었다.
그러다가 6월 29일, 항복선언이 있고나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놀았다.
숙제를 밀린 채 2학기가 시작되었고
국어선생님은 안 보이셨다.
출산휴가를 받으셨던 것이고
대신 강사로 젊은 여선생님이 오셨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젊은 여선생님보다
나는 김혜숙(순)선생님이 참으로 그리웠다.
볼록 나온 배를 흔들며 뒤뚱뒤뚱 수업을 진행하시던 친근한 모습이 그리웠을까?
(흔히 느끼는 첫사랑 여선생님은 아니다, 그때는 지존 영어선생님이 있었기에...)
아무튼 10월 경 선생님은 돌아오셨다.
2개월된 아들 '봉구'(예명)에 대한 소식을 가득안고
돌아온 선생님을 우린 무척 반겼고(혹은 나만)
선생님은 초보엄마답게 수업시간 중 종종
'봉구에피소드'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셨다.
선생님은 내게 별명도 지어주셨는데
민망해서 특별히 밝히긴 싫다-_-
그래도 난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국어성적이 제일 좋았으니까-_-v
그리고 12월
내기억으로는 처음인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날이 왔다.
선거운동에 대한 기억은 별로 나지 않는다.
그건 6월달의 '장관'보다 분명 흥분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물론 내가 투표보다는 버블버블을 좋아하는 중1 까까머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선거날 밤
항복선언을 했던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깊게 담배를 빠시던 모습이 생각날 뿐이다.
다음날 아침 1교시 국어수업
겨울방학이 얼마남지 않은 우리는 수업진도도 다 나갔겠다
무척이나 떠들고 짓까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무말도 안하시고 탁자에 서 계셨다.
진도도 다 나갔으니 자습인가보다...
당근 우리는 선생님 눈치 볼 것 없이 왁자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우리를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탁자만 내려보시고 뭐 그런식이었다
(그걸 일일이 기억하는 건 내가 앞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리라)
아무튼 수업시작 후 한 10분간 계속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은 왠일인지 아무말도 안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셨다.
미동도 않는 선생님에게 아이들도 슬슬 초조해질 찰나
선생님은 교탁을 탁탁 치셨다.
그래도 떠드는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앙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다.
"니들이나 니들 부모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요즘같으면
그런 선생님의 일갈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이나
그말을 듣고도 우리는 떠들기만 했다.
선생님은 혼자 씩씩대시는가 싶더니
잠시 후 진도도 끝난 수업을 이어나가셨다.
국어선생님이 교실에서
좌판처럼 떠드는 우리들을 그날 아침,
우리의 부모들까지 싸잡아 욕하며 흥분하셨던
87년 12월 어느날 아침의 순간을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그런 일갈의 배경과 선생님의 심정을 그때
어린 나조차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한심했으면,
우리들한테까지 그런 투정을 부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국어선생님, 요즘 몹시 생각난다.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생 '봉구'의 학부형이겠지.
그리고 나는 87년의 선생님 나이이고,
그동안 나는 몇번의 선거에 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아왔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87년 12월, 국어수업,
선생님의 한마디를 기억하며
19일엔 꼭 투표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나는 아무에게도 독설을 늘어놓고 싶지 않다
다만
진보하는 세상을 믿으며 건배하고 싶을 뿐
물론
김혜숙(순)선생님도 그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