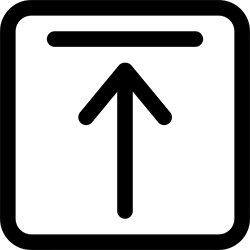일요일에 모처럼 조카가 놀러왔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치마만 입겠다는 고집스런 취향도 생기고,
매일 양쪽으로 머리를 묶는데도 어느 땐 꽈리처럼 동그랗게,
어느 땐 구불구불 길게, 또 어느 땐 천안에 돌돌 말어넣어 중국인형처럼,
옷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바꾸는 나름의 심미안(?)까지...
고모에겐 만만한지 반말하다가도
지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꼬박꼬박
"잡수세요"같은 고난도(?)의 존대말을 하는
이제 3돌 하고 몇 개월 지난, 쪼끄만 꼬마인데요...
조카가 가고 나서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일이 있어
적어봅니다.
에피소드 1. "이게 뭐야"
조카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붙이고는
바나나를 맛 있게 먹더니 제 앞에 보란듯이 껍질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화 난 듯 일부러 인상을 쓰고는
"어? 수현이 너... 이게 뭐야?"
그랬더니 조카가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바나나껍질이야."
잠시, 말문이 막혔던 저는, 아이가
야단치는 걸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 고
결심했죠. 그리고는 아주 다정하게,
"수현아, 수현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거 먹구 나서
어디다 버리라고 그랬어?"
"쓰레기통에." 조카가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원했던 대답이 나오자 전 더 다정하게,
"그래, 그럼 이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게 뭐야..."
"바나나껍질이야."
"..."
"알아, 그래, 바나나껍질인데...
수현이가 먹었으니까 수현이가 버려야지 이게 뭐야..."
"바나나껍질이야."
"..."
그 후에도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이게 뭐야"와
그에 이어지는 조카의 나름대로 성실한 대답인 "바나나껍질이야"는
몇 번을 더 반복해서 서로의 진을 뺐습니다.
에피소드 2. "가위 바위 보"
어느 놀이에나 빠질 수 없는 '가위 바위 보'의 역관계(?)는
진작부터 가르쳐주고 싶었던건데
조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말도 통하고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양손을 동원해서 한 손은 가위로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보와 바위를 내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가위'는 알지만 '바위'나 '보자기'를 모르는 조카에게
형체만으로 설명을 한다는 건 예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잘 알아듣고 몇 개의 예시도 통과(?)하길래
과감하게 온식구를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마치 '랜디' 앞에서 초능력 검증이라도 받듯이
<3년 5개월짜리 아이에게 '가위 바위 보' 정확하게 이해시켰나 못시켰나> 테스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장한 표정으로 오른손으로 가위 왼손으로 보를 낸 후
"수현아,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기지?"라고 물었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흔들어 힌트를 주고 싶었지만
흡사 'PD감정단'이라도 된 것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된 가족들이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양손을 번갈아 보더니 알겠다는 빙긋 웃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볼우물이 패였습니다.
저도 마주 보고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수현아, 누가 이길까?"
이윽고, 조카가 애교가 잔뜩 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모가."
"..."
조카가 맞고 제가 틀리다, 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