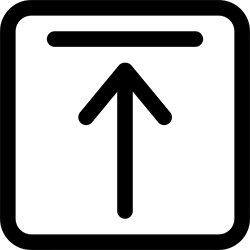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 한달전 쯤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아니 내가 사는 마을이라고 표현해야 더 옳을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사는 마을에는 왕복 2차선의 도로 옆에 폭이 20여 미터 정도 되는 제법 넓고 큰 냇가가 있다. 장마철에는 물이 불어 무려 3미터 이상 수위가 상승해 도로를 덮치기도 한 적이 두번씩이나 있을 만큼 대단한 위세를 과시하는 규모다. 평상시에는 기껏해야 어른의 발목을 조금 덮을 정도의 깊이로 죽은 물이 흐르지만...
그런데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여기 저기가 파헤쳐지고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논이 메워지고 돈 많은 곳에 있어야 할 쓰레기들이 꾸역 꾸역 밀려들면서 건강하던 하천은 금새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월드컵에서 4강을 하면 뭐하나? 그곳에 살던 물고기들은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사를 왔을 때만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고기들이 저희끼리 모여서 한가롭게 헤엄을 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서울에서는 감히 구경 할 수도 없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천은 이내 생활하수와 공장의 오폐수로 인해서 자연생태계의 천연미를 잃고 불도저와 기타 중장비에 의해서 바닥이 획일적으로 파헤쳐지면서 무슨 거대한 빗물도로관 같은 것으로 변해버리더니 급기야는 부족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복개가 검토되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
당연히 거기에 살던 생물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대신 끈적끈적한 녹조류와 썩어버린 파래 더미 같은 시커먼 풀 종류들이 건조하게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서 태양을 피하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떠내려온 프라스틱과 공사현장의 폐자재들 먹다버린 과자 봉지와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드럼통과 각종 자재들의 집합소와 같은 몰골로 용도 변경된게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바닥의 자갈들은 교감이 더이상 불가능해진 생명수와의 과거를 그리워하며 사막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절규의 고통을 난반사하고 있었고 홍수로 인해 붕괴된 도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개축된 축대는 참 반듯하게도 시멘트로 무차별적으로 거대한 장벽이 축조되면서 더이상 백로들이 날아와 개구리나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하천은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 마을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아니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거대한 석조각이 서 있다. 그 밑에서는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말이다.
물이 썩는 다는 것은 이미 그곳이 어디이던 간에 70%가 썩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일부러 외면해야만 무지하고 게으르고 뻔뻔한 우리의 심장에 별 다른 충격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한달 전쯤에 나는 우연히 그 축대를 걸을 기회가 있었다. 별 다른 생각없이 밑을 바라보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눈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살펴보니 놀랍게도 한마리의 물고기였다. 그것도 거의 30 cm나 되는! 아마도 잉어거나 붕어였을 것이다. 나는 눈을 의심하면서 천천히 녀석을 살펴보았다. 당시 수심은 기껐해야 30cm, 어도는 물론 설치되지 않아서 나는 대체 그 커다란 물고기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됐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가 잡아서 거기다 풀어주었을리는 없을테고, 그럼 본류에서 지류로 흘러들다가 길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대체 뭘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국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물고기는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좁은 어항속을 다소 절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금붕어처럼 뫼비우스의 8자 운동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류로 올라갈수록 바닥을 드러낸 부분이 많아서 녀석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비좁은 웅덩이에서, 썩어버린 시커먼 물속에서 뻐끔거리며 숨을 쉬는 녀석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나는 그날의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다. 작은 기적을 목격한 벙어리 같은 심정이었다.
가끔씩 나는 그 웅덩이 속의 물고기가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내가 녀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겼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건 내게 별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버림 받았다고 여기고 있던 그곳에 생명체가 살아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생명체는 내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던것이 아닐까?
그 파문이 감동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할까? 낙태율 세계최고의 나라에서!
문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물통 가득 국화가 움을 트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