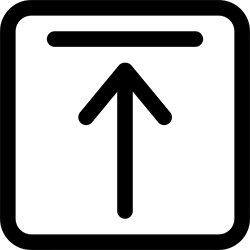한 일주일 전 쯤인가?
초저녁 술약속을 마친 이가 살짝 풀린 눈으로 자리를 일어서는, 혹은 지독한 워크홀릭이 텅빈 사무실 문을 닫고 바쁜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시간에 지하철을 탔다.
몸이 녹아 푸른색 벨벳에 스며들기라도 하듯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원인 모를 피곤함이 양쪽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파고 든다.
문득 문득 목적 없는 시선을 날리다 오른쪽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한 사내에게 눈길이 갔다.
그 사내는 한 달, 아니 석 달 이상 감지 않은 머리에, 감지 않은 머리보다 더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몸을, 그 몸보다 오랫동안 빨지 않았을 옷으로 덮고 있었다.
나이를 가늠하긴 힘들었지만, 중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좀 다녔거나 했을 나이 같았다.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의 사내였지만, 새까만 때 아래 숨어 있는, 아직은 어린 듯한 얼굴 생김새나 그 얼굴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눈동자가 여는 노숙자와는 다른 무엇을 뿜어내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강한 반항심이 서려 있는 사내의 눈빛은 옆 모습을 봐도 부담스러웠다. 행여 사내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사내의 눈 안에 서린 반항심이 가시고 한결 편안해진, 아니 한결 느슨해진 눈빛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한다.
뱀이 스물스물 자신의 굴로 기어 들어가듯 그의 오른손이 다 헤어진 점퍼의 주머니를 헤집는다.
곧 때가 꼬질꼬질 낀 오른손 주둥아리가 만원자리 몇 장과 천원자리 몇 십장을 물어 올린다.
이제 사내는 장사꾼 같은 낯빛으로 물어 올린 지폐들을 헤아린다.
얼핏 봐도 6,7만원은 족히 넘어 보인다.
사내는 다 헤아린 돈을 정성스레 간추린 뒤 살포시 반으로 접어 뱀의 입에 물려 보금자리로 돌려 보냈다.
그리곤 다른손 뱀의 주둥이로 너덜너덜한 걸레같은 앞머리를 몇 번 쓸어 넘겼다.
사내는 압구정 역에서 내렸다.
사내가 내린 자리에는 미처 사내의 육체를 따라가지 못한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듯 했다.
오늘 또 그 사내를 만났다.
차림새는 일주일 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걸음걸이나 행동이 딴 사람 같았다.
비스듬히 꺽인 왼발은 바닥을 끌며 힘겹게 오른발을 좇아 가고 있었다.
왼손 역시 왼발 못지 않게 뒤틀려 주둥이론 코팅된 메모지 한 장을 힘겹게 쥐고 있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1급 지체 장애자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이 저에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충 이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들고 양쪽 의자에 앉은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메모지를 보여줄 때, 그의 시선이다.
그의 고개는 뒤틀린 팔다리와 같이 뒤틀려 있다. 뒤틀린 고개 때문에 걸레같은 그의 앞머리가 그의 시선을 살짝 덮는다.
그가 약간씩 고개를 떨 때마다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읽으려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 드러났다 사라졌다 한다.
그런 시선이 메모지를 든 왼손의 손떨림과 함께 상대방을 강하게 짓누른다.
소리 없는 약탈, 말 없는 강탈이라 느껴졌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 차츰 내게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링"에서 TV 속을 빠져 나와 스크린으로 다가오는 귀신의 모습과 같았다.
마침내 그 사내가 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마트면 괴성을 지를 뻔 했다.
힘들게 그의 시선을 피한 나는 그 사내가 1분 1초라도 빨리 다음 사람에게 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지하철 보다 더한 무게의 압력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 숨이 막히고,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악'이라는 외마디 비명이 목구멍 바로 아래 다다랐을 때, 그 사내는 고개를 돌려 다음 사람에게로 멀어졌다.
또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사내가 저만치 멀어지자, 일주일전 사내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메멘토"의 편집된 기억이 정리되듯 사내의 일상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다.
원인 모를 피곤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불만이 뒤엉켜 사내를 향한 분노로 변한다.
'만약 나에게 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 저 사내의 목을 따 버리고 말 테다.
아니, 그것 보다는 조용히 사내의 뒤를 밟은 뒤, 사내가 한적한 곳에 이르면, 처참히 난도질 하고 이제는 사내의 돈이 된 승객들의 돈을 뺏았는 게 낫겠다!'
사내는 다음 칸으로 사라진다.
벨벳에 녹아 들어간 피곤한 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나의 목적지에서 내리는 것 뿐이다.
사내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당신을 압니다.'
라는 말을 건네고 싶다.
나는 그 사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지하철 3호선에서 본 그 사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