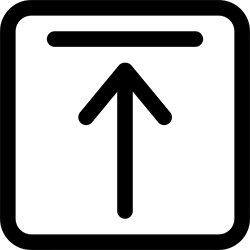지금도 1년에 한번씩은 전화를 한다.
10여년 전 전화번호가 바뀌지않고 살아있다.
왜 그녀는 10여년 전 전화번호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걸까?
벨이 울리고 그럼나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녀가 받기전에...
매일 생각나는 그녀이다.
매일 생각하는 그녀이다.
그러다가 1년에 한번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본다.
"정은이 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요"
목소리를 한번 듣기위해 다시 1년을 기다린다.
1년치 마음이 쌓이고, 1년치 용기를 꾹꾹 눌러담아 흘러넘칠때가 되면
다시 전화를 걸어볼 것이다...
밤거리 번화가를 걷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람과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건 아마도 은은한 네온과 가로등이 찰나에 만들어 보여주는 환상일 것이다.
사람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신기루 일것이다.
왜 나는 방금전 스쳐지나간 한 여인을 되돌아보는 걸까?
왜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일까?
어깨를 간드리며 잦은 바람에도 살랑거리는 검은 머릿결,
자주색 원피스에 노란 머리띠,
그리고 흔하지 않은 저 복숭아 냄새나는 향수,
그녀와 스쳐지나치는 그 짧은 순간, 고동치는 나의 가슴안에서
오랫동안 삮여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나를 위해 밤지새며 울어주던 그녀였다.
그녀를 업고 병원을 찾아헤맨 밤거리도 있었다.
내가 싫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차갑게 미소지으며 돌아서버린 그녀였지만
아스팔트위에 번져가는 그녀가 떨어뜨린 물방울 하나때문에
매달릴 수도 화를 낼수도 없었던 그 시절의 마지막도 있었다.
남자와 손을 꼭잡고 걸어가는 한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져간다.
이것이 그녀와 나 사이에 허락된 인연의 전부란 생각도 들었다.
밤거리 번화가의 한 모퉁이에 서서 자판기 캔커피 하나를 꺼내어 마셨다.
달콤하고 맛있었다.
강변, 사람들 틈에서 밤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불놀이를 보고 있었다.
어깨를 살짝 덮은 검은 머릿결을 가진 내 앞의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주색 원피스에 노란 머리띠를 한 그녀에게서 흔하지 않는 복숭아 향기가 난다.
눈이 마주치고, 밤하늘이 채색되어 가던 그때 우린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다.
불놀이를 등에지고 함께 걸었다.
강변 숲길사이에서 벌레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넘실거리는 강물위로 가끔씩 물고기가 뛰쳐올라와서는 다시 강물로 뛰어들어간다.
사람들이 뜸한 한적한 길위에 서서 그녀가,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나를 가볍게, 그리고 강하게 껴안아 주었다.
"오랜만이야, 왜 이렇게 오랜만인거니"
그녀가 나를 껴안아 주어서 다행이다.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울고있던
엉망진창이던 내 얼굴을 보지 못해서 다행이다.
멀리 하늘위에서 해처럼달처럼 반짝거리며 사라져가는 불꽃이 어른거려 보인다.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밤은 처음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혼자서 저만치 뛰어가다 서서는 돌아보며 소리친다.
"우리 내일 벚꽃 나무아래 게시판 앞에서 보자, 약속해 꼭 온다고"
학교앞 벚꽃 나무밑엔 늘 그녀와의 약속장소로 쓰던 게시판이 하나 있다.
4월이면 벚꽃이 눈처럼 떨어지며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아름답게 해주었다.
깨어나보니 새벽 시간... 멀리 전차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며
작고 어둔 방안이 나즈막히 흔들린다.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비가 내리고 있다.
불도 켜지않은채 냉장고 안에 넣어둔 맥주하나를 꺼내어 한모금 마신다.
눈가의 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냈는데 축축하게 젖은 베게를 보고선 그냥 울컥해 와버렸다.
울면서 맥주마시는건 또 얼마만이냐...
며칠후 일요일 학교를 찾아갔다.
만날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전차를 타고, 한참을 걸어서 학교앞에 도착했다.
높아져버린 콘크리트 담장과 담장너머로 빼곡한 새 건물들,
그녀와 함께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벚나무는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약속장소로 쓰던 게시판도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해저물어 가는 노을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신호등앞에 섰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생각했다.
꿈을 깨지않았더라면 다음날 학교앞 벚꽃나무아래 게시판에서 그녀를 만났을까
그녀를 만났더라면 우린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
사람들 틈에서 젖어가는 눈을 가리기위해 멀리 노을지는 저녁하늘을 또 한없이 바라다봤다.
이제 오늘부로 떠나간 여자는 더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웃집 예쁘장한 아줌마와 어떻게 하면 말을 나눌수 있을까,
혹은 국6년때 짝사랑하던 경희와 무슨 건수로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자.
더이상은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는 생각지 않겠다.
어쩌다 가끔 꿈속에 등장해서 내 맘을 휘젖는 짓도 하지말고..
아무튼 어디서던 잘먹고 잘살아라. 그리고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