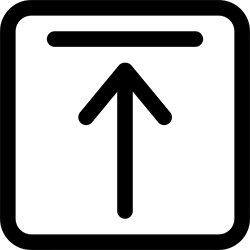영화를 보다, 또 소설을 읽다가, 하다못해 이러저런 평론이나 칼럼을 읽다가도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한순간 내가 뭐나 된다고 열등감이란걸 갖는단 말인가, 우스워져서 피식거리는데...
열등감이라는 것도 '레벨'이 동등하지는 못해도 엇비슷은 해야 추진력이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화라도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택도 없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열등감은 도무지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기대해볼 수도 없고 자기연민이나 심하면 자학으로까지 수직낙하하는, 그다지 마주치기 싫은 감정이다.
최근에 정성일씨가 씨네21에 기고한 김기덕감독과 관련한 글을 읽다가 논쟁의 중심이 된 낡은 테제로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관심'으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한 그 냉정한 태도에서 비슷한 징후가 일었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왼쪽에 앉으면 그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오른쪽에 앉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지 대항하지 않으면서 주위를 돌다가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를 찾을 노력에 게으르다.
나 역시 그런 게으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열등감의 징후는 아직까지 그저 열등감인 채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메나바르의 <디아더스>는 그 미니멀함, 세계관으로까지 확장되는 그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고도 태연자약한 형식과 수수께끼에 집중하는 스토리의 단선성-실은 단선적인 체하는-으로 나를 짓눌렀다.
이건 이리 틀고 저리 틀다 급기야 순서를 전복시키고 그 형식에 많은 것을 의존했던 <메멘토>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온 충격이었는데, 그 여파는 훨씬 대단한 것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바이올린의 현이 뿜어대는 단순하면서도 신경증적인 '음향'-이것은 음악이라기 보다 음향에 가까웠다-과 조심스런 카메라의 움직임, 끝까지 관객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편집의 리듬까지... 나는 숨이 막히는줄 알았다.
쳇, 결국 내가 할 수 있는거라곤 감탄 뿐인거지.
최근 한국의 저예산 영화들처럼 일주일간 극장에서 힘겹게 버티다가 비디오 시장으로 빠르게 직행한 <유 캔 카운트 온 미>에서 인물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이야기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거나, 우리가 흔히 '일관성'이라는 말로 얽어매기 쉬운 캐릭터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캐릭터들로 생생하게 되살려낸 노력들이다.
시종일관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붐마이크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 작은 영화는 헐리우드 가족영화들이 마무리짓는 어설픈 화해에서 비껴나있으면서도 인물들이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은근하고 현실적인 가족애를 그려냄으로써 호흡 느린 이야기에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이 영화는 열등감보다 일종의 부러움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고 그런 헐리웃영화들에 손가락질을 해대도 그들은 그 시장안에서 이런 작은 영화들이 조용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꺼이 화답하는 관객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토양을 지켜나간다.
이런 열등감에서 괴롭게 헤매이지 않을 수 있는 때는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뿐이다. 그들의 '레벨'에 필적할 수야 없겠지만, 그 순간엔 나도 그들 못지 않게 고통스럽고 그들 못지 않게 행복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