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친구들과 복수전을 한뒤 선배 송별회를 갔다가
얼큰히 술에 취해 은정씨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집에 가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을까....
뭐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얼큰히 술에 취해 은정씨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집에 가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을까....
뭐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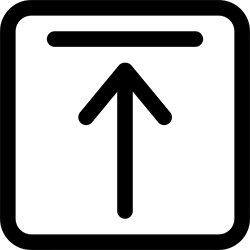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
|
|---|---|
 |
ty6646 |
| 2007년 05월 16일 03시 11분 13초 1822 3 | |



| 글 등록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시간나시면 보세요.. 안보신분.. 폴 포츠 4부작.. 그리고 테너들 동영상 3 | sandman | 2007.08.13 | 4557 |
| 꿈속의 할리 박. 5 | sadsong | 2007.08.07 | 1781 |
| 대한뉴스와 화려한 휴가 2 | 3822724 | 2007.07.28 | 1617 |
| 담배가 쓰네요.... 6 | sandman | 2007.07.22 | 2048 |
| 복면달호를 보고서 2 | ty6646 | 2007.06.27 | 2396 |
| 오덕후의 영화보기 3 | 73lang | 2007.06.17 | 7527 |
| 연출부의 영화보기 1 12 | image220 | 2007.06.04 | 3147 |
| ↓↓↓↓↓ goldfish님을 위한 동영상 맆흘.... 5 | sandman | 2007.06.04 | 2131 |
| 사랑이 변한다 | goldfish | 2007.06.02 | 2426 |
|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들... 1 | cityman | 2007.06.01 | 2110 |
| 식중독 5 | kinoson | 2007.05.29 | 1820 |
| 노대통령의 굴욕.... 4 | sandman | 2007.05.28 | 2149 |
| 놈 놈 놈 3 | 73lang | 2007.05.27 | 2838 |
| 터미네이트와 로보캅 맞짱뜨기 1 | sandman | 2007.05.25 | 1751 |
| 신연예인 5탄 ...(주의:사운드 나옴 19歲未滿視聽禁止) 1 | sandman | 2007.05.18 | 2385 |
|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2 | kinoson | 2007.05.18 | 2047 |
| 기분좋은 시간 1 | ty6646 | 2007.05.18 | 1566 |
|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3 | ty6646 | 2007.05.16 | 1822 |
| 연락하세요 9 | hal9000 | 2007.05.06 | 2018 |
| 유치하고 싶은 분들께. 4 | sadsong | 2007.04.14 | 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