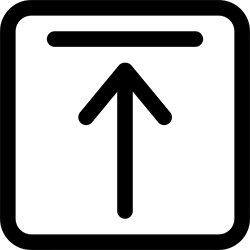하는 일 없이 밤을 새우고, 새벽같이 신문을 거둬 읽어본다.
습관처럼 뒷면부터 읽으려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을 징그럽게 확인시켜주는 커다란 기사.
애써 '효심'같은 단어 머리속에서 지우고, 그냥 읽어본다.
====================================================================================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한다는 요즘. 가정의 달 5월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정의 의미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족이 해체된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옳은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느 어부 부자(父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천리 길,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동해안을 따라 30분을 내려가야 만나는 작은 포구마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에 사는 아버지 서정운(68)씨와 아들 석권(40)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오늘도 고기는 안 잡혔다
새벽 4시. 눈을 뜨자마자 아들은 옆자리의 아버지를 바라봤다. 숨을 멈춘 듯 평온한 모습. 아버지 코앞에서 숨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아들은 자리를 일어선다.
아버지가 중풍에 걸린 지 어느덧 십년째. 1994년 어느 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바닷일을 나갔다. 그러나 고깃배에 오르기도 전에 쓰러졌다. 오른편 전신 마비. 아버지는 그 뒤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겨우 방바닥을 기어다닌다.
대소변을 가리기는커녕 말도 못한다. 멀뚱히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다. 두유 한 병을 아버지 머리맡에 갖다 놓고 방문을 연다. 바닷일을 마치면 얼추 오전 8시30분쯤. 두유로 허기를 때운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들을, 아니 아침밥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고기는 안 잡혔다. 열 마리 남짓이 전부다. 지난 한달 수입은 겨우 12만원. 지난해 수해 뒤로 월 30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 아직도 해안선엔 장난감.냄비 같은 세간살이가 떠밀려 온다. 인근해 어장엔 이제 희망이 없다.
◆ "이젠 엄마 곁으로 가 버리소."
방문을 열었더니 똥냄새가 진동을 한다. 체육복 바지에 똥을 싼 채로 아버지는 TV만 보고 있다. 아버지는 보통 일주일에 두번 큰일을 본다. 하지만 요즘엔 부쩍 횟수가 늘었다. 벌컥 화가 났다.
"어제도 질러놓더니 오늘도 그러면 어떡하노! '추리닝'이 두벌인데 뭐 입고 있을라고!"
아들에 눈길 한번 주곤 아버지는 다시 TV를 바라봤다. 대꾸라도 하면 그나마 나을까.
여느 어촌처럼 갈남리도 도박과 술로 흥청대던 시절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동네에서도 내놓은 '난봉꾼'이었다. 평생을 해녀로 일하며 3남2녀를 키워온 어머니는 예순도 안된 92년 갑자기 세상을 떴다.
아버지가 쓰러지자 동네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수군댔다. 마침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막내(석대.31)가 당분간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다. 나머지 네 남매는 외지 생활이 너무 빠듯했다.
체육복 바지를 빨고 왔더니 아버지는 그새 아침밥을 다 먹었다. 감각이 없어 주면 주는 대로 다 먹는다. 자신의 체육복 바지를 아버지에게 갈아입혔다. "뭘 잘했다고 밥을 다 먹노! 또 싸지를라고 그라나! 이제 엄마 곁으로 가 버리소!"
◆ 아버지와 아내
아침 8시30분.점심 12시30분.저녁 6시30분. 그는 한번도 식사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 그물을 손보다가도 끼니 때만 되면 일어섰다. 공공근로라도 나가면 벌이가 좀 나을 텐데 하루종일 집을 비울 수 없어 매번 포기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배멀미가 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향을 떠났다. 도장(塗裝)기술을 배워 도시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다. 아내(김수옥.38)를 만난 것도 충북 제천의 한 현장에서였다.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와 93년 결혼했다.
2001년 가을 그는 막내 석대를 도시로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막내 나이 스물아홉. 막내도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다. 장남으로서 더 이상 면목이 없었다. 그의 설득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여전히 제천에서 식당일을 한다.
아내와 약속을 하나 했다. 5년 기한을 둔 것이다. 아내도 그 뒤엔 자신이 없다고 했다. 벌써 2년이 지났다. 3년 뒤에도 아버지가 지금의 모습이라면…. 바다에 아버지와 아내의 얼굴이 교차돼 지나갔다.
◆ 돌담을 허물다
갯마을의 담벼락은 높고 두껍다. 커다란 바윗돌을 하나씩 쌓아올린 모양새도 무척 견고하다. 방파제 겸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집 담장은 독특하다. 집안을 둘러싼 10m 길이의 담은 양 끝만 높다란 돌담일 뿐, 가운데 7m는 무릎 높이의 낮은 벽돌담이 자리잡고 있다.
작년 늦가을께. 아버지가 마루까지 나와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체를 애써 바로 세우려고 했다.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봤다.
아들은 그때 보았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아들은 보았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높이에선 돌담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까지 아들은 정말 몰랐다. 돌담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지. 당신은 돌담 너머 바다를 보고 싶었던 거다.
다음 날 그는 돌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높이 1m30㎝.두께 60㎝의 돌담을 그는 묵묵히 부숴 나갔다. 수많은 바윗돌을 혼자 들어내고 내다 버렸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높다란 돌담이 있던 자리엔 낮은 벽돌담이 대신 들어섰다.
오늘도 아버지는 마루로 나와 있다. 돌담을 허문 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번씩 마루로 기어서 나온다. 아버지 곁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쪽빛 바다. 아버지를 돌아봤다. 당신의 눈동자에도 바다가 들어와 있었다.
삼척=손민호 기자<ploveson@joongang.co.kr>
=======================================================================================
부성을 신화화시키지도 않았고,
아들의 효심도 지나치게 추켜세우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
그러나, 그가 바다를 가로막은 돌담을 허무는 그림이 자꾸 머리속에서 리플레이 된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엄마와 대판 싸웠다.
요즘들어 부쩍 마음이 약해지신 엄마.
별 일 아닌데도 서운해하시고...
감정이 상해 할 말 못할 말 다하신다한들, 딸이라서 그런건데...
그걸 못참고 쨍쨍대다가 그만하자며 가방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아직 철 들려면 멀았다. --
대체, 엄마의 바다를 가로막은건 뭘까.